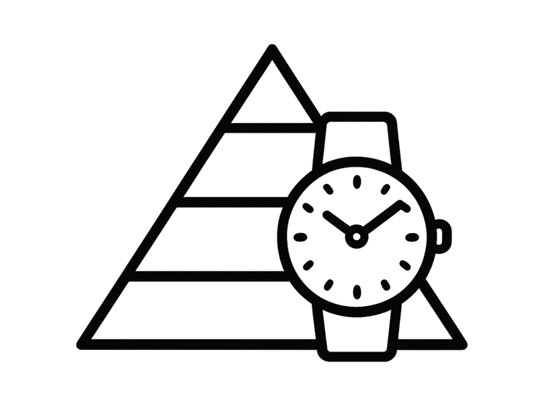
1987년에 개봉한 영화 <월스트리트>의 주인공 고든 게코는 옷차림으로 상대방을 파악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계가 없는 사람을 두고 거침없이 말한다. “저 사람에 대한 모든 걸 파악했다.” 손목 위에 시계 하나 없는 사람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뜻이다. 영화가 개봉한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시계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는 시계를 통해 사람을 평가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확한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다. 이제 시계는 시간을 확인하는 도구 그 이상이다. 그날의 룩을 완성하는 하나의 패션 액세서리이자 취향을 드러내는 도구, 더 나아가 때로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호가 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시계는 종종 취향보다 계급의 상징으로 작동한다. 손목 위에 어떤 브랜드 시계가 놓였는지가 그 사람의 경제력, 직업, 사회적 지위까지 설명해주는 듯한 착각이 존재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계 계급도’가 대표적인 예다. 시계 브랜드를 피라미드 형태로 나열한 일종의 표다. 하이엔드 시계 3대장, A등급 브랜드 등 가격에 따라 시계 브랜드의 등급을 나누고 특정 등급 이하 브랜드의 시계를 구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간다. 글 아래에 “이 브랜드는 ‘급’이 어떻게 되느냐”는 댓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브랜드 이름은 하나의 계급표가 되고 나열된 지표는 당연한 질서처럼 받아들여진다. 시계를 사회적 위치를 상징하는 일종의 계급장으로 여기는 셈이다.
만연해진 계급도
사실 이는 시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계급도로 가득하다. 부동산 입지, 자동차, 스마트폰, 심지어 프랜차이즈 치킨까지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된다. 최근 러닝크루가 인기를 얻자 소셜미디어에는 운동화 계급도도 등장했다. 비교와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자산과 소비재는 곧 누군가의 가치를 말해주는 상징으로 변질된다. 이는 ‘좋아 보이기 위한 소비’가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는 배경이기도 하다.
지금 유행하는 계급도의 시초로 여겨지는 밈(meme)은 2000년대 중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0대 사이에서 등산 브랜드 노스페이스 패딩이 유행하며, 패딩이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아이템이 됐다. 어떤 브랜드, 어떤 모델을 입었는지에 따라 급을 나누는 게 유행했다. 계급도에서 최상위권 모델을 사주기 위해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에서 비롯된 신조어 ‘등골 브레이커’까지 등장할 정도다. 시간이 지나며 패딩 계급도는 다른 분야로 확장됐고 시계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계급을 의식하게 됐을까. 업계 전문가들은 ‘파노플리 효과’로 설명한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소비의 사회>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특정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마치 그 계층에 속한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의미한다. 브랜드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브랜드로 사회적 지위를 신경 쓰는 경향성이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23년 엠브레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떤 브랜드를 착용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 보인다’는 응답은 44.3%에 달했다. ‘명품을 들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의견도 42.1%나 됐다. 소비가 단순한 소유를 넘어 사회적 평가와 연결돼 있는 셈이다.
소비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문제는 이런 소비가 쉽게 과열된다는 점이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자신의 선택조차 확신할 수 없는 구조는 무리한 소비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자신의 선택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끊임없이 계산하다 보니 물건을 사는 기준이 ‘내가 좋아서’가 아닌 ‘남들이 좋다고 할 만해서’로 바뀌기 쉽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명품 소비에 사용하고, 시계를 고를 때에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제품보다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게 된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시계는 ‘진짜 시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브랜드 이름 하나로 정체성과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는 결국 소비의 즐거움마저 앗아간다.
대형 브랜드든 마이크로 브랜드든, 좋아하는 시계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시계다. 가격과 브랜드는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소비 구조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약 5,000만 명의 럭셔리 소비자가 시장을 떠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던 소비자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실용성과 진정성으로 시선을 돌렸다. 럭셔리 리테일 분석가인 마리 드리스콜(Marie Driscoll)은 “2019년 이후로 럭셔리는 가격만 오르고, 서비스나 품질, 혁신은 따라오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가 단순히 잘 보이기 위한 고가의 물건보다, 자신이 공감하고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계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도 이와 같다. 더 이상 브랜드 이름만으로 모든 것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 고가의 제품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만족하기는 어렵다. 대형 브랜드든 마이크로 브랜드든, 좋아하는 시계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시계다. 가격과 브랜드는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계를 찼을 때의 기분과 그 시계가 담고 있는 나만의 이야기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고른 시계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시계다. 타인의 시선과 시계 계급도를 넘어 내 손목 위의 시간을 나답게 즐길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게재호
99호(07/08월호)
Editor
서지우
© Sigongs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l rights reserved. © by Ebner Media Group GmbH & Co. KG
댓글0
